
|
 |
|
지난 호에서 강원지역에 건립된 스님이 아닌 일반 불교도의 부도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강원권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을까.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일반 불교도의 부도로는 무학대사의 어머니 부도가 조선 초기인 태조 연간에 금강산의 금장암에 건립되었고 세종 연간에 행호선사의 어머니 부도가 함양 안국사에 건립된 사실을 지난 호에서 찾아보았다. 고려말 주자학에 매료된 신진사대부들이 조선 전기에 스님을 비난할 때 자주 언급한 일이 출가(出家)이다. 부모와 집을 버리고 피도 섞이지 않은 스승을 찾아 삭발하고 절에서 우주의 침묵을 깨겠다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반인륜적이라고 극렬하게 성토하였다. 정말 스님들이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사찰에서 수행 정진만 했을까? 그랬다면 무학대사나 행호선사는 어떻게 어머니의 사리탑을 사찰에 그것도 자신과 매우 인연이 깊은 사찰에 세울 수 있었을까? 이는, 이렇기 때문이다. 모든 스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찰에서 지켜야 할 여러 법도가 있고 수행에 정진해야 할 여러 여건들이 세속의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가를 했다고 하여도 속가(俗家)의 부모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산 것은 아니었다. 고려말, 원증국사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3)는 38세가 되던 해에 고향인 양평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또한 평생을 출가자인 스님으로 살다가 부여 무량사에서 돌아가신 설잠(雪岑)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문집인 『매월당집(梅月堂集)』에 다음의 시가 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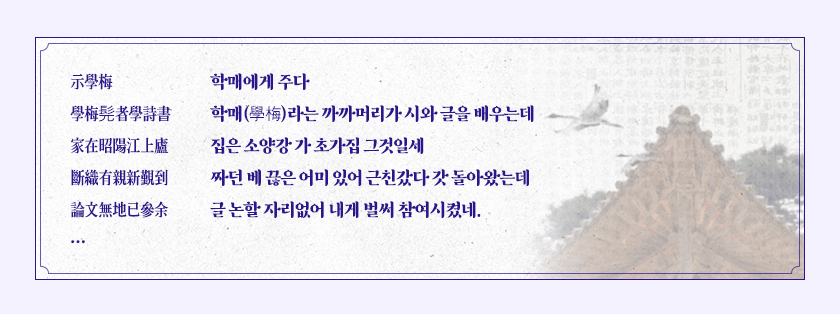 |
| 이는 설잠스님이 1455년 세조가 단종에게서 명목상 왕위를 선양받는 사건이 벌어지자 영해박씨 문중 7인이 은거한 김화 초막동으로 조상치와 함께 퇴거하고 얼마 후 춘천 화음동(지금은 화천 사내면)으로 옮겼다가 춘천 청평사에 머물면서 학매를 가르칠 때 지은 시이다. 학매는 스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찾아 문안을 드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강원도의 금강산 정양사와 천덕암, 청평산 청평사, 오대산 진여원과 환적암, 설악산 봉정암에서 수행한 환적당 의천(義天: 1603~1690)은 11세(1613년)에 출가하였으나 45세(1647년)가 되어 고향인 선산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셨다. 그러다가 임피현(지금은 군산시)의 보천사 인근에 작은 집을 지어 유모와 사내 종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고, 51세가 되던 해에는 21세부터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松葉)만을 먹었는데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30년간 먹던 솔잎 대신에 곡식을 먹게 되었다. 춘천 청평사 양신암에서 환적당 의천의 제자가 된 풍계명찰(楓溪明察: 1640~1708)은 가야산 해인사로 수행처로 옮기면서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무경자수(無竟子秀: 1664∼1737)는 스승인 추계스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으로 가서 상례를 마친 후 스승의 다비 의식에 참여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스님들이 속가의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소통이 이어졌다. 이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무학스님이나 행호스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고 봉분이 있는 산소 대신에 부도라는 묘탑(墓塔)을 건립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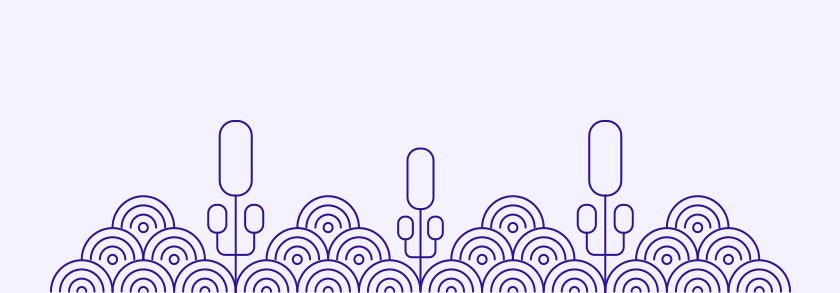 |
 |
|
하지만, 조선 사회가 안정되고 향약이 확산되면서 생활풍습이 유교화되자 화장하는 장례 풍습은 출가한 스님에게만 적용되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 불교를 대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배척이라기보다는 방임(放任)으로 흐르게 되자 재가자의 부도가 다시 건립되기 시작한다. 재가자의 부도는 건립 연대나 주인공의 생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립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부도의 모양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양식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짐작이 된다. 이러한 모습을 각 도(道) 별로 찾아보자. 충청도 지역에 금산군 신안사와 서산시 천장사에 각기 1기가 있는데 신안사에는 「청신보인지탑(淸信菩人之塔)」이라 했는데 ‘청신’과 ‘보인’은 재가자 중에서 여성의 부도로 추정된다. 천장사에는 탑신에 「청신녀배씨선주행생사리부도(淸信女裵氏善住行生舍利浮屠)」라 새겼다. 부도에 ‘청신녀’는 분명 여성을 의미하고 ‘배씨’는 성이 배씨라는 뜻이므로 재가자인 여성의 부도임이 확실하다. 전라도 지역에는 고창군 문수사에 2기, 김제군 금산사에 1기가 있다. 문수사에는 재가자의 부도가 2기이다. 1기는 「진주강씨탑(晋州姜氏塔)」이다. 이는 성이 ‘강(姜)’씨인데 본관이 ‘진주’인 사람의 부도라는 뜻이다. 남자라면 이름이 있거나 ‘처사’ 또는 ‘거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지만 속성만을 사용한 것은 여성임을 의미한다. 1기는 「송청정심탑(宋淸淨心塔)「이라 했다. 이는 속성이 ‘송(宋)’씨이고 법명이 ‘청정심’인 사람의 부도라는 뜻이다. 이 부도에서도 성씨와 ‘청정심’이라는 여성이 사용하는 법명을 사용한 것을 보면 재가자인 여성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김제 금산사에도 재가자 부도 1기가 있는데 탑신에 「처사 김준영(處士 金俊永)「이라 새겼다. 이는 재가자이면서 남성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
 |
| 광주광역시 증심사에는 재가자 부도 3기가 있다. 다른 사찰에서 보는 재가자 부도와 달리 석탑을 모방한 형태이다, 건립 시기는 오래되지 않아 일제강점기 이후에 건립되었다. 탑신에 새겨진 「대덕화안혼탑(大德華安魂塔)」에서 ‘대덕화’는 여성에게 사용하는 법명이다. 「강진최씨지탑(康津崔氏之塔)」도 속성이 ‘최’씨이고 본관이 ‘강진’인데 남성에게 사용하는 거사나 처사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보면 역시 부도의 주인공이 재가자이면서 여성으로 생각된다.「조씨정행화화탑(曺氏淨行華化塔)」은 속성이 ‘조’씨이고 법명이 ‘정행화화’로 역시 재가자 부도이면서 여성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심사에는 재가자의 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의 공덕비가 여럿이 있다. 즉,「청신녀정토행김장성선행비」,「청신녀묘화광서우죽기념비」,「청신녀정월광이희춘영생비」,「청신녀청정행구룡수성비」,「청신녀조씨정행화화공덕비」,「청신녀상락행김성배귀진비」등이다. 이들은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공덕비이다. 이 비문들을 볼 때 모두 ‘청신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석의 주인공이 여성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씨정행화화탑(曺氏淨行華化塔)」과 「청신녀조씨정행화화공덕비」는 동일한 사람의 부도와 공덕비임을 알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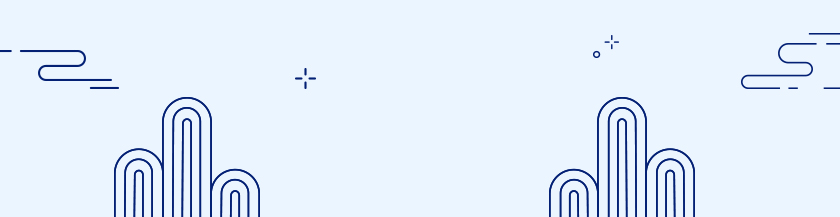 |
 |
| 구례 천은사는 10기의 부도가 있는데 이 중에 2기가 재가자의 부도이다. 하나는 「현공처사박∇∇탑(玄空處士朴∇∇塔)」이라 새겨져 있다. 속성이 박씨이고 법명이 현공인 남성 재가자의 부도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부도는 「장성서씨사리탑(長城徐氏舍利塔)」이라 새겼는데 이는 장성서씨의 부도로 역시 속성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재가자 여성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
 |
|
경남 양산시 통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어서 불보종찰(佛寶宗刹)로 일컫고 있다. 50여 기의 부도가 한곳에 있어 그 모습이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재가자의 부도는 3기이다. 1기는 「청신녀동허당법명탑(淸信女東虛堂法明塔)」이다. 그런데 ‘청신녀’라 하면서 ‘동허당’이란 당호와 ‘법명’이란 불교식 이름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가자이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옥산김씨(玉山金氏)」라 음각한 부도가 있는데 속성만을 부도명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여성 재가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처사연화당묘성대사(處士蓮花堂妙成大師)」라 새긴 부도가 있는데, ‘처사’라 하면서도 ‘연화당’이란 당호를 사용하고 ‘묘성대사’라는 스님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앞에서 본 강릉 보현사의 「청신거사운월당필정대사(淸信居士雲月堂弼淨大師)」에서도 동일한 예가 확인된다. 이 역시 일제강점기의 대처승과 관련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식은 보면 2기는 종형이고 1기는 원형의 기단부에 사각형의 탑신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으로 강원권을 벗어나 한국에서 확인된 재가자 부도를 살펴보았다. 부도의 양식은 팔각원당형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건립하기 쉬운 범종을 닮은 종형부도였다. 또한 부도의 외면에 별다른 문양이 새겨지지 않고 부도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법명이나 속성을 새겨 놓았다. 재가자 부도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일반 신도들이 사찰 중건에 참여하거나 사찰 경영에 기여하고 자신과 가정에 복을 구하고자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진 사회현상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재가자의 부도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가자 부도의 건립 시기, 건립 지역, 부도 양식 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한국불교사회사, 석조미술사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문화유산을 ‘그렇다’라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던 틀에서 ‘그렇지도 않구나’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전향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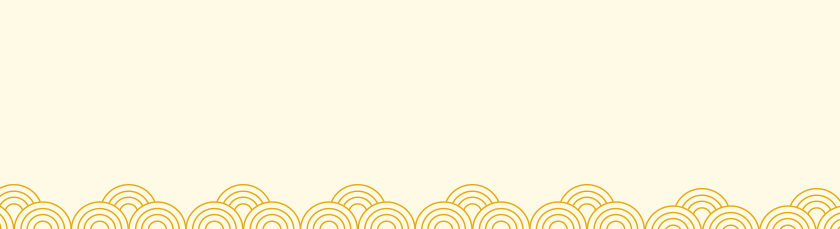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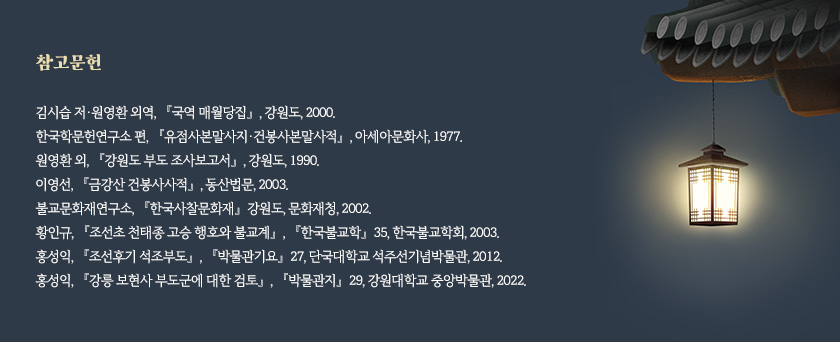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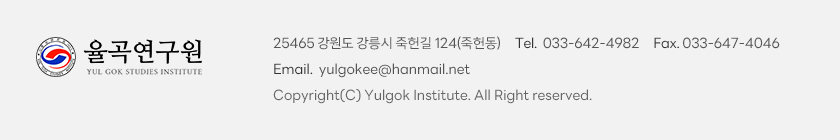 |